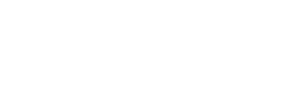조직은 민주주의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곳의 목적은 평등하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직은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 하나의 미션을 바라보고 치고 나가서 달성해나가는 것이다. 치고 나가서 달성하기에 적합한 조직마다의 방식이 있다.
그 방식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황파악, 의견제시, 판단기준, 의사결정, 결론도출 등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어 있다. 조직이란 일종의 유기체다. 조직이 겪는 현상은 다양하고 활동 또한 다양하므로 조직의 메커니즘을 하나로 정의하기란 어렵다.
조직의 메커니즘은 곧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만의 방식”이다. 문제를 찾아내는 것 / 문제를 정의하는 것 /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는 것 / 문제해법을 실행하는 것 – 전체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공정이나 방법론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공정과 방법론이라면 다른 상황에 옮겼을 때도 작동하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만의 방식’은 다른 조직으로 옮겨지지도 않고, 옮기더라도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만의 방식”은 이 곧 조직의 구심점이다. 모든 구성원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같아야 한다. 같은 방식을 갖춘 사람을 합류시켜야 한다. 같지 않아도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을 합류시켜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만의 방식”을 지키지 못할 사람은 핵심조직 안에 들여선 안 된다.
함께 뭉쳐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 드러난다. 별도의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문제를 함께 풀면서 각자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 문제를 정의하는 판단, 해법을 제시하는 창의력, 실행하는 수행능력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여기서 ‘이끌든지’는 빠져야 한다. 적어도 지금의 내 상황에선 소용없다. ‘이끌든지’는 적임자, 총책임자의 문제해결방식의 개별성과 독창성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인데, 나는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2명짜리 조직이다. 조직이 20명을 넘기기 전까진 ‘이끌든지’는 필요없을 것 같다. 그럼 “따르든지, 비키든지”만 남는다. 조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단순명료해졌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구심점을 강요해야 한다. 구심점을 고집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사라진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 구심점에 맞지 않는 사람을 평가하고 해고할 필요도 없다. 구심점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알아서 모이고, 알아서 비킨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알아서 모일 수 있도록 구심점을 공개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선택지가 없다고 마음을 쓸 필요도 없다. 없다면 그냥 없는대로 가면 될 일이다.
내 문제해결방법이 모든 문제를 풀진 못한다. 당연하다. 그리고 괜찮다. 나는 모든 문제를 풀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문제만 잘 풀리면 그만이다. 그 문제를 푸는데 내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개선하면 된다. 우선 내 방법이 옳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의심은 소용없다. 옳은지 그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책에 나와있어도 나의 것이 아니다. 잔소리를 해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경청하더라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끝을 봐야만 내 방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을 보는 것만이 문제해결 방법을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끝을 볼 때까지는 내 방법을 믿어야 한다. 세상엔 다양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푸는 조직도 많지만 문제해결방식이 문제의 갯수나 조직의 갯수만큼 다양하진 않다. 제대로 일하는 곳은 다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취향이 반영되거나 내가 창안한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옳다고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 방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옳은 방식이라 표현하면 좋겠다. 옳은 방식대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내 방식이 옳다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면 좋다. 문제를 찾고 정의하고 풀어나가며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구심점만 생각한다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우리만의 방식”을 가시화하기 위해 슬로건을 만들어 붙이거나 매일 외칠 수도 있다. 송파구에서 일잘하는 10가지 방법 포스터를 만들거나, 우수한 사례에 수상하는 등의 문화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강령을 만드는 것은 실수다.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기계어로 작성된 알고리즘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 헌법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심점을 제시하는 것과 행동강령을 하달하는 것은 작동원리가 정 반대다. 바라보게 하는 것과 관리당하는 것은 힘의 작용이 정 반대로 일어난다. 구심점을 추구하면 구성원의 능동성을 이끌어내지만 룰을 하달하는 순간 피하달자는 수동적으로 변한다. 지시와 통제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피하달자에게 하달하는 순간 서로 마주보게 된다. 마주보면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한다.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쓴 적은 있다. <1> <2>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다. 적어도 이 글이 선언된 덕에 조직에 맞지 않는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었다. 남은 구성원은 이 글에 공감하고 또 같은 태도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내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적어도 명문화된 구심점은 작동한 것이다.
하지만 글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글이 쓰여져 있으면 근거가 된다. 명문화하고 선포해서 모든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글만 쓰고 최소한의 시범을 보여주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우리만의 일하는 방식 없이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삽질을 하는 안쓰러운 상태로 접어들었다.
간다. 오면 오는대로 같이 가고 없으면 없는대로 홀로 간다. <leadership lesson from dancing 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