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듬이
더듬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아바타의 나비족처럼 머리끄덩이를 잡아 붙여다가 소통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송신속도도 높아지고 데이터 손실률도 줄어들 것이다. 또는 스타트렉의 벌컨족처럼 얼굴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기억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아쉽게도 난 그런 첨단 더듬이를 달고 태어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말과 글을 통해 소통한다.
언어란 게 다 뭔가? 내 머리통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타인의 머리통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치는 과정이다. 여러 전달 수단 중 말과 글이 있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하면 입이 아프고, 글을 많이 쓰면 손가락이 아프다. 더듬이가 여러 측면에서 우월하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원시적이고 제한적인 소통 수단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은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증명된 셈이다. 더듬이가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속이 터지지만 어쩔 수 없다. 차세대 첨단 더듬이가 테크크런치에 소개되고, 실리콘밸리 머니를 투자받은 후, 임상시험을 거치고, 시중에 유통되어 얼리어답터들의 피드백을 반영함으로, 3번째쯤 버전으로 고도화된 뒤, 중국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가격안정권에 들어서야, 나 같은 천민도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생에 구경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말이나 글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야겠다.
언어의 다양함은 사고의 폭을 넓힌다. 반대로 언어의 제한적인 활용은 사고의 폭을 좁힌다. 감정의 폭도 좁힌다. 라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어휘의 단조로움은 미개함이다. 야만이다. 문명의 적이다. 인간 문명의 발달이 언어의 발달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문명의 방향은 어휘를 잘게 쪼개는 쪽으로 향한다.
아이는 꿀밤을 맞으며 말을 배운다. 한 아이가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 불러 엄마에게 꿀밤을 한 대 맞는다. 사람을 칭하는 단어가 ‘아빠’, ‘엄마’ 뿐인 줄로 알았던 탓이다. 그제야 집에 사는 남자는 ‘아빠’, 집 밖에 사는 남자는 ‘아저씨’라는 개념을 습득한다. 다음날 만난 한 고등학생을 “아저씨”로 불렀다가 한 대 더 맞는다. 집 밖에 사는 남자가 늙었으면 ‘아저씨’, 젊으면 ‘형’이라고 개념을 쪼갠다. 개념을 쪼개지 못하는 것은 신생아의 미숙함이다. 야만이다. 문명의 적이다.
바이럴 영상
영상제작 거래중개를 시작한 지 8개월이다. 제출되는 포트폴리오 대부분 제목 뒤에 ‘바이럴 영상’이라고 붙어 제출된다. 800개 중 300개가 자칭 바이럴 영상임을 주장한다. 이 어휘는 죽었다. 사용할수록 의미가 정의되긴커녕 모호해진다. 의미를 쪼개고 구체화하긴커녕 허상으로 포장된다.
바이럴 영상이라는 표현은 분별력을 잃었다. 이젠 거의 모든 것에 바이럴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배우가 출연하는 광고부터 모션그래픽 광고까지, 형식을 불문한다. B급 유머코드 광고부터 울음유발 공감 광고까지, 스타일을 불문한다. 판매촉진 비디오커머스부터 기업 브랜드 CF까지, 장르를 불문한다. 2억 규모 제작비에서 50만 원 싼마이까지, 너도나도 바이럴을 갖다 붙이기 바쁘다.
바이럴 영상의 본래 정의는 ‘소비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영상’이다. 자발적 확산을 이루지 못했다면 바이럴 영상이 아니다. 이 표현은 결과를 나타내는 용도보다 미래 지향적인 용도로 더욱 자주 사용된다. “자발적인 확산을 목표로 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 말한다. 이런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목적 달성에 실패한 영상까지도 바이럴 영상으로 불릴 때 문제는 발생한다.
자칭 바이럴 영상이라 주장하는 영상 100개 중에서 실제로 바이럴 성과가 있었던 것은 1개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가 워너비에 파묻혔다. 1개의 실제 바이럴 영상을 바이럴 영상이라 부르면 나머지 99개의 영상과 동급으로 여겨진다. 실제 바이럴 영상을 칭할 방도가 사라졌다. 타인의 성공을 빌어 입고 자신을 포장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끝내 한 단어를 죽이고 말았다.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꿀밤을 때리고 싶다. 정의(定義)의 꿀밤으로 어휘의 세분화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싶다.
개념 정의 기능이 부족한 어휘는 성장을 멈추고 소멸하는 게 보통이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미 죽을 때를 한참 넘긴 어휘가 왜 아직도 펄펄 날뛰는지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방대한 개념의 어휘 때문에 곤혹스럽다. 미스케이션이 난무한다. 의사 소통 단계가 늘어난다. 업체 검증 기간이 길어진다. 제작 회의는 난항을 겪는다. 실컷 만들었더니 이건 아니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댄다.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기가 막힌 작품을 기대하라더니 웬 엉뚱한 걸 만들어 놨댄다. 프로젝트는 파멸로 향하고 각자 민사소송을 준비한다. 그 지경을 겪고도 어째서인지 언어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떠들기만 하는 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캤다. 영상산업의 언어 정화를 위해 발을 벗는다. 적어도 내가 만든 플랫폼 안에서는 모호한 어휘의 남용을 허용치 않는다. ‘바이럴 영상’을 적폐로 공표하고 척결에 나선다. 300개에 육박하는 자칭 바이럴 영상의 제목을 일일이 수정한다. ‘웹 CF’, ‘소셜미디어 최적화 영상’, ‘병맛나는 연출’, ‘공감유도영상’으로 더욱 세분된 명칭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는 오늘도 값진 야근을 했다. 사회적인 약속을 파기하는 언어 습관을 일부라도 정제시켰다. 첨단 더듬이가 없는 이상, 이게 나의 최선이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에 집착이
지나칠 정도로 까탈스러운 원칙주의자가 운영하는
영상제작 거래중개 서비스
비드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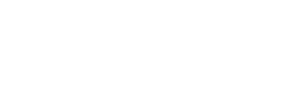

좋은 글입니다. 글을 읽고 나니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정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